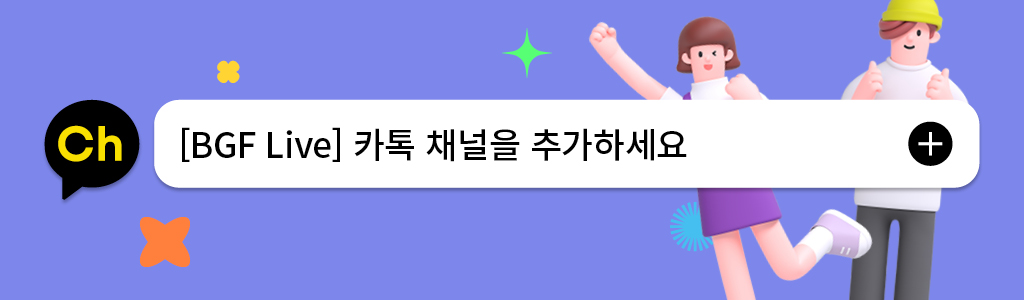[ESSAY] 연말의 베이스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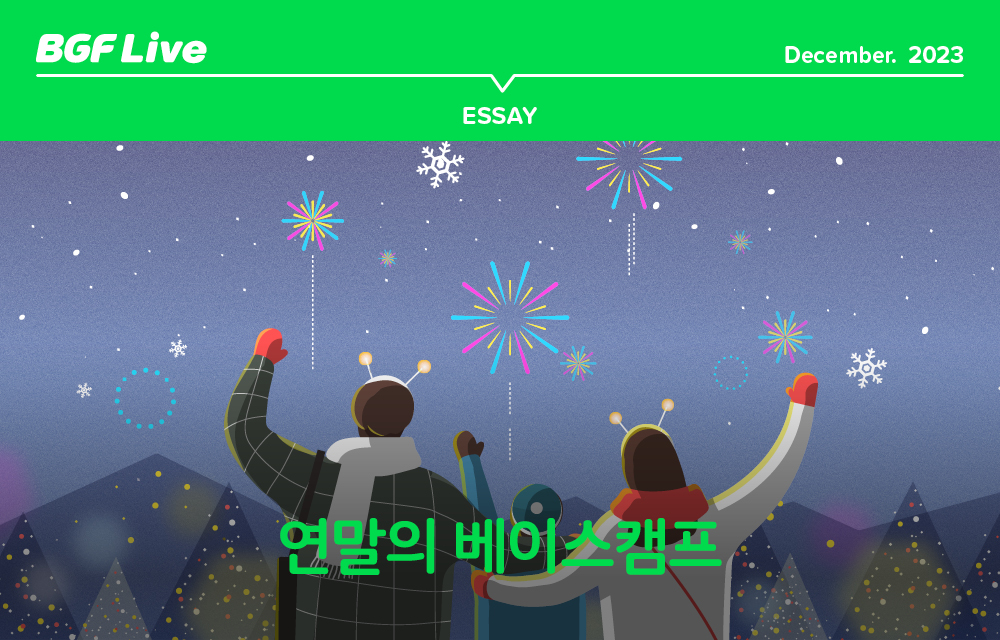
한 해의 끝. 무언가 특별한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이 아닐 겁니다. 이맘때면 올해도 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칭찬도, 선물도 해주고 싶지요.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연말, 들떠 소란해진 세상 가운데 한결 같은 일상을 지키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있어 우리는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말의 편의점에서 떠올린 작은 생각들을 여기 적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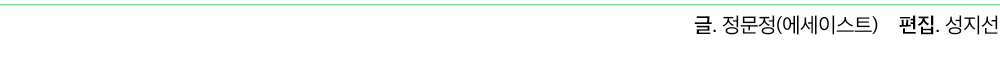
저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태어났습니다. 12월 24일이 생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좋겠다” “그럼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생일선물도 받겠네” 같은 말을 하는데 어느 쪽도 사실이 아닙니다. 12월 24일에 태어난 사람은 12월 2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보다야 덜 억울할 뿐이며 유년시절 부모님께 받은 선물은 크리스마스 겸 생일을 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산타가 없다는 것도 일찍 알아차렸어요. 진짜 산타가 있다면 제게 공책과 연필, 속옷처럼 어차피 곧 사야 하는 것만 매번 딱 맞춰서 줄 리가 없으니까요. 당일에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들 가족과 보내는 거라 생각하기에 초대하는 게 실례 같기도 했고, 망설이는 동안 이미 기나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어버렸거든요.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핸드크림이나 립밤을 선물로 받는 경우가 많아 손 두 개와 입 하나로는 결국 다 쓰지 못한 채 다음 생일을 맞이하고야 맙니다. 제일 특별한 생일 선물은 케이크였어요. 산타 장식도, 트리 장식도, 메리크리스마스 글자도, 루돌프도 없는, 단순한 딸기 생크림 케이크. “그동안 크리스마스 장식이 있는 건 많이 먹어봤을 테니까. 특별히 이런 케이크를 가져왔지.” 선물한 이의 말대로 생일에 크리스마스 장식이 없는 케이크를 그때 처음 먹어봤습니다. 보통의 케이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오히려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행을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그 후 슬리퍼를 신고 나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특별해지는 비법은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든 남들이 안 할 때 하거나 남들이 다 하고 있을 때 안 하면 됩니다. 저는 특별히 생일 당일은 집에서 조용히 보냅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어디를 가도 비싸고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붕 떠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음 달 카드값을 보고 울게 됩니다. 대신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행을 갑니다. 특히 이때는 일 년 중에서 어쩐지 제일 부록처럼 느껴지는 날들이에요.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기엔 늦었고 새해 인사를 하기에도 다소 이른. 회사원인 남편에게도, 프리랜서인 저에게도 일이 제일 없는 때이기도 하지요.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어디서든 숙박비가 저렴해지고 한산해지니까, 제 진짜 생일파티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작년에는 통영에 일주일 머물렀고 그 전에는 강릉에 갔었어요. 지방 소도시로 여행을 갈 때는 일단 시내를 파악해 둡니다. 가까운 시내가 어디에 있는지만 알아두면 안심이지요. 작은 동네일수록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것이 그 반경 내에 대부분 모여 있으니까요. 그것만 머릿속에 입력되면 숙소에 체크인을 한 뒤 짐을 풉니다. 여행을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는 그 후 슬리퍼를 신고 나가 가까운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겁니다.
생일파티 주간에 매일 밤 마셔야 하는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을 하나씩 사고, 새우깡과 꼬깔콘 같은 기본템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매대를 둘러봅니다. 그러다보면 1+1이나 2+1 스티커가 붙은 과자를 반드시 함께 구매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이 썩는다고 사주지 않는 초코우유나 젤리, 사탕 같은 것도 선심 쓰듯 아이에게 하나 쥐어주고요. 어차피 편의점은 여행 내내 올 것이니 그때그때 생각나는 걸 충동적으로 삽니다. 뒤늦게 떠오른 칫솔, 면봉, 손톱깎이, 양말 같은 걸 계산대에 올리기도 하고요. 그런 걸 산다고 해서 자책하지 않는 마음도 여행에서는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짐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전에 지쳐 버리기 쉽고 심지어 왜 안 챙겼냐고 서로 탓하게 되니 필사의 힘을 다해 내려놓아야 합니다. “짐을 나름 열심히 챙기긴 했지만 분명히 뭔가 빠져있을 거야. 없으면 가서 사지 뭐” 라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오래도록 수련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곳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내려놓고 별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편의점은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편의점에 가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그건 단순히 예측 가능하고 만만한 가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찾는 것이 이 안에 있으리라는 믿음, 특유의 익숙한 냄새, 합리적인 동선을 따라가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분류와 배치. 그 안정감 때문에 여행지에 갈 때마다 자주 편의점을 찾게 됩니다. 딱히 살 게 없는 날도 습관적으로 구경하곤 하죠.
여행만 가면 편의점에 매일 들르는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 휴식하러 떠난 여행이라도, 부지불식간에 머리와 몸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행 중에는 화장실에 잘 가지 못한다는 분이 꽤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무의식과 습관으로 처리하는 일이 많은 일상과 달리 여행지에서는 ‘이번엔 어딜 갈까’,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 맞을까’, ‘너무 비싸게 산 건 아닐까’, 고민하고 결정하고 의심하는 과정 속에 있지요.
예측 가능한 곳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내려놓고 별 생각 없이 쉬고 싶을 때, 편의점은 훌륭한 휴식처가 되어줍니다. 긴 시간 비행한 뒤 대형 체인점처럼 부러 익숙한 공간을 찾는 사람들의 동기도, 시차적응이 힘든 데서 한식당을 찾거나 라면을 끓여 먹는 마음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일수록 가깝고 익숙한 위안을 하나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왕 도전을 택한 거라면, 이왕 여행을 간 거라면 계속 설레야 한다고, 끊이지 않고 새로움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일탈할 수 있으려면 마음 한켠에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한다는 걸. 그건 자존감일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어요. 벨트를 하고 있어야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안전끈을 발목에 착용해야 번지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목적지에 빠르게 갈 수 있을지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중간에 쉬어갈 곳을 미리 찾아둡니다. 떠나고 싶은 사람일수록 가깝고 익숙한 위안을 하나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제 아이에게 그런 안전기지가 되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저라는 베이스캠프를 믿은 덕에 까마득히 멀어지면 좋겠습니다. 돌아올 곳을 확신한 채로 모험하면 좋겠습니다. 더 멀리 가고 싶어서 오랫동안 헤매던 당신, 추운 연말마다 가고 싶어지는 곳은 어디인가요?
정문정 에세이스트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저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