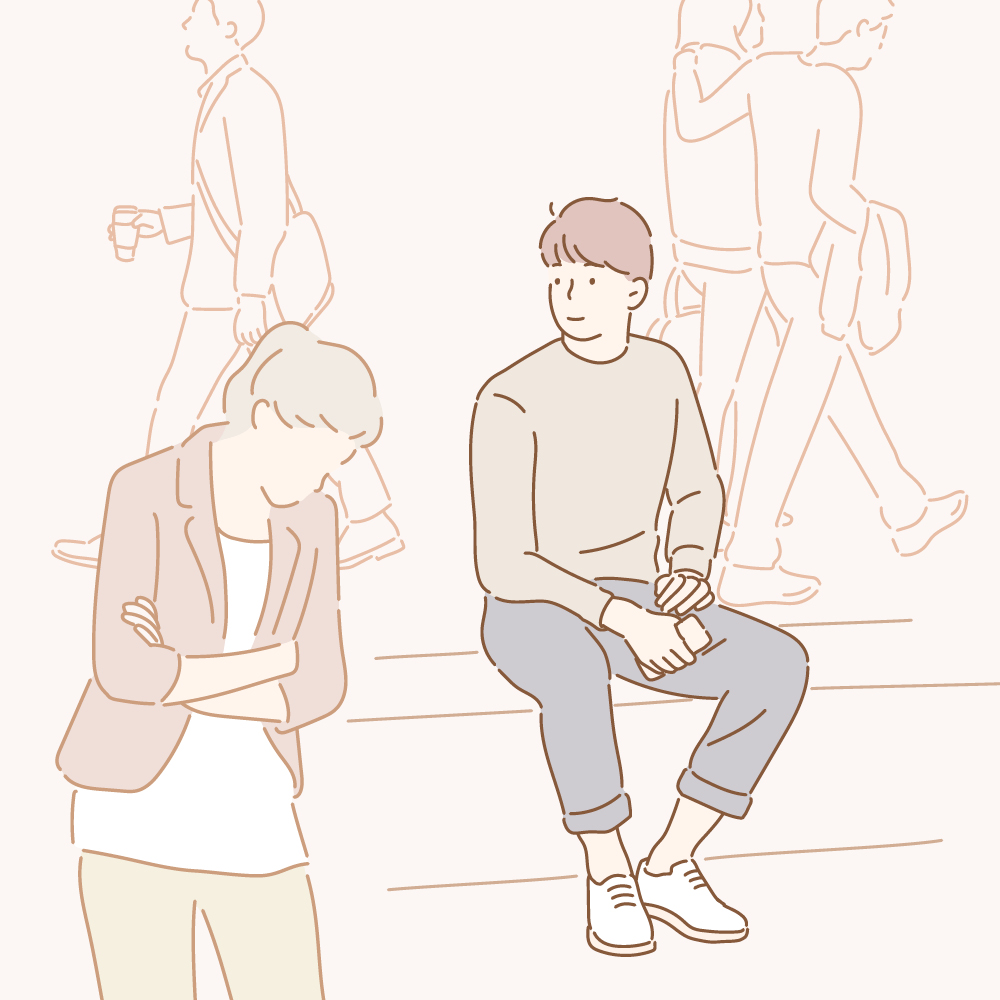[ESSAY] 서울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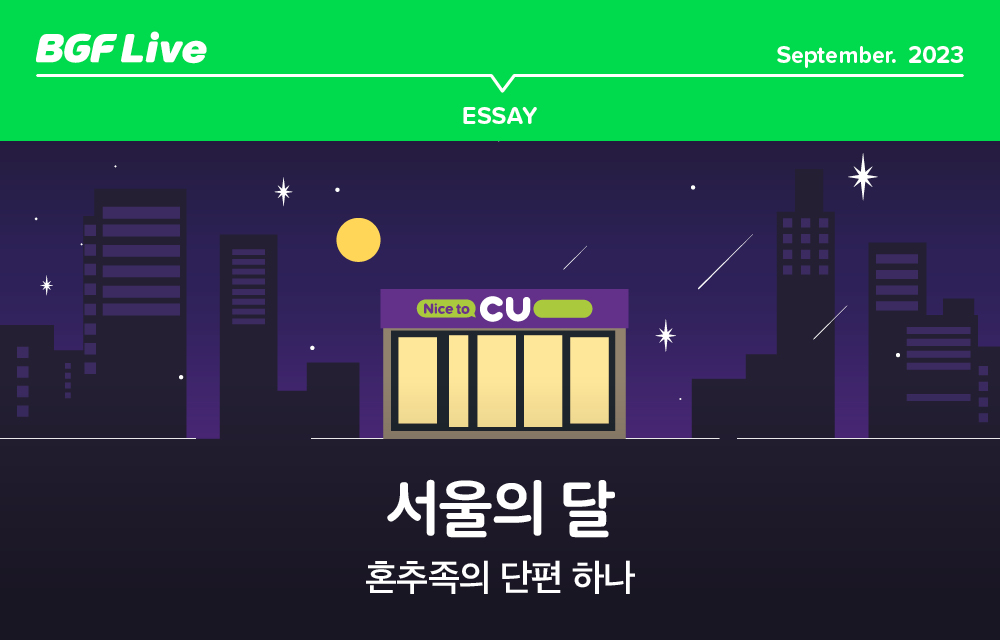
휘영청 뜬 한가위 달이 도심을 공평하게 비춘다. 그래서 혼자 추석을 보내는 이에게 달빛은 정겨운 벗이다. 가만히 어깨를 도닥이는 달을 따라 어둔 골목을 걷다 보면 저 멀리 등대처럼 나를 기다리는 간판이 보인다. 귀성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도시에서도 불을 밝히는, 편의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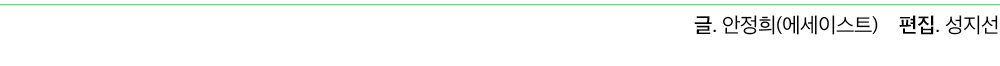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9월의 어느 날, 엄마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 면회는 하루에 단 두 번. 의사 선생님께 알 수 없는 의학용어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시끌벅적한 세상 속 외딴 섬처럼 홀로 선 듯한 기분에 시달리다 집에 들어오면 그만 기진맥진하여 어둠 속으로 고꾸라지곤 했다. 달빛은 창문을 넘어 어미 잃은 새처럼 자꾸만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날도 그랬다. 얼마를 잤을까, 밤인지 낮인지 모를 시간에 나는 깨어났다.
나를 깨운 것은 고소한 기름 냄새였다. “엄마?” 나의 목소리가 허허롭게 공중을 떠돌았다. 냄새가 나는 곳은 윗집 아랫집 옆집이었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지글지글 굽고 찌고 볶고 난리일까. 공연히 심술이 났다.
배가 고파 마트에 갔지만 과일이나 채소는 없었다. 분식집도 국숫집도 아니 식당이란 식당은 죄다 문이 닫혀 있었다. 마치 세상이 나를 곯려 먹겠다고 약속이나 한 것 같았다. 욕지기를 내뱉으려는데 식당 앞에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추석 연휴 휴업’.
아, 추석이구나. 오늘이. 하필이면.
안 보이던 게 보였다. 마트 앞의 선물 세트, 한산한 도로, 선물을 손에 들고 인사하고 인사받는 가족들, 그리고 추석에 혼자인 나, 온종일 굶은 나.

서러웠다. 원래 명절을 싫어하지만, 명절 음식도 몇 젓가락 먹으면 질리지만, 싫어서 피하는 것과 졸지에 혼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였으니까. 내가 뭘 그렇게 뜨겁게 잘못했다고 추석에 가족끼리 모이지도 못하고, 추석 음식도 못 먹고, 친척들의 결혼하라는 말에 화도 못 내고, 이렇게 혼자 굶고 있을까. 검은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금방이라도 터지려는 울음을 꾹꾹 삼키며 걷던 그때였다. 빤짝. 어둔 골목 끝에 뭔가가 반짝거렸다.
뭐지? 흐린 눈으로 쳐다보니 반짝거림의 정체는 편의점 간판이었다. 식당도 엄마도 아닌 편의점. 추석에 편의점이라니! 하지만 식당도 휴업한 지금 내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나는 편의점의 빛을 의지하며 어둔 골목을 벗어났다.
딸랑~ 편의점에 들어왔지만,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았지만, 막상 사고 싶은 게 없었다. 추석날 편의점에서 대체 뭘 사서 먹어야 하는 걸까.
그때 계산대 옆에 놓인 간편식 쌀 떡국이 보였다. 아마 사장님이 혼자 드시려다가 손님이 오니까 옆으로 밀쳐놓은 것 같았다. 문득 지난 설에 엄마랑 먹은 떡국이 떠올랐다. 명절이니까. 나는 간편식 쌀 떡국을 집어 들었다. 쌀 떡국에 뜨거운 물을 붓고 창가에 앉았다.
어둔 골목은 거울이 되어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두 손으로 감싸주고 싶을 정도로 지쳐있는 내 얼굴을. 절망하기 싫어서, 무너지기 싫어서 나에게 말해주었다. 꼭 듣고 싶었던 말을.
‘힘들고 외로웠지? 그래도 잘 이겨냈어. 장하다. 참 장해.’
기분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되려 울컥해지고 말았다. 울기 싫어 차라리 떡국을 씹었지만, 너무 급하게 먹은 걸까. 콜록콜록 사레들리고 말았다.
눈물이 쏙 빠지도록 콜록거리던 그때.
툭!
옆에 무언가가 놓였다. 조그마한 볶음김치.
나는 볶음김치는 안 샀다고 말하려고 돌아보았다. 볶음김치를 내 옆에 놓아둔 사장님은 계산대로 돌아가 간편식 쌀 떡국을 드시고 계셨다. 그 옆엔 작은 볶음김치 봉지가 놓여있었다.
뭐지? 선물인가? 시끌벅적한 추석에 섬처럼 서 있는 자들의 유대? 사는 게 고단한 자들의 유대? 뭐 그런 건가. 뭐든 상관없었다. 돈 달라면 주지 뭐.
나는 볶음김치 봉지를 북 뜯었다. 그리고 쌀 떡국 위에 올려놓고 먹었다. 쫄깃한 떡국과 진한 사골국물과 간간한 볶음김치는 찰떡궁합이었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따뜻하고 편안한 음식인지. 나는 정신없이 쌀 떡국을 먹기 시작했다. 뜨끈한 사골 국물을 쭉 들이켜자 송곳처럼 뾰족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배가 부르니 세상이 살만해지고 너그러워졌다. 다 잘 될 것 같았다. 엄마는 그 어려운 수술을 잘 이겨내셨고, 중환자실에서 곧 나오실 것이며 돌아올 설에는 나와 마주 앉아 떡국을 드실 것이다. 그래, 그럴 것이다.
‘사는 게 꼭 떡국 같네.’
설익을 때도 있고 푹 익어 퍼질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설익으면 많이 씹으면 되고 푹 익으면 조금 씹고 훌훌 넘기면 그만이었다. 훌훌 넘기는 게 너무 힘들면 볶음김치 하나 얹어 먹으면 그만이었다. 어쩌면 내가 원했던 건 볶음김치만한 작은 위로였을지도 몰랐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휘영청 뜬 밝은 달 아래 어둔 골목을 등대처럼 지키는 무수한 편의점 불빛이 보였다. 시끌벅적한 날 외딴 섬처럼 홀로 선, 그러나 혼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였다.
*작가 안정희
대구 내당동에서 엄마의 순한 막내딸로 태어났다.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를 나와 엄마의 자랑이 되었고 KBS 2FM 가요광장 작가를 하느라 엄마와 떨어져 살았으며 엄마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 때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다. 에세이집 <언젠가 눈물나게 그리워할 하루>를 출간하였다.